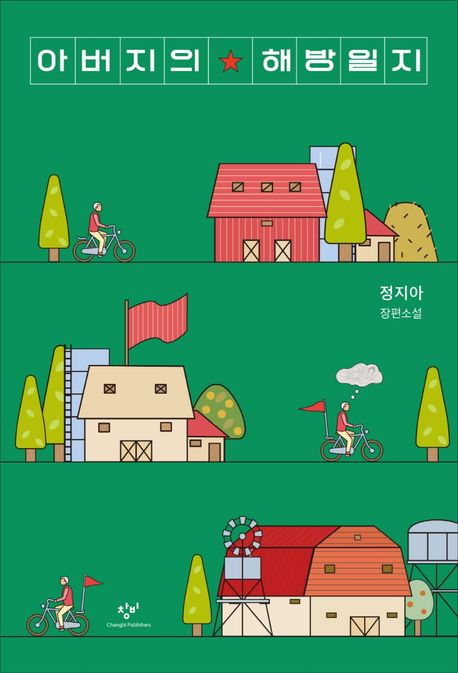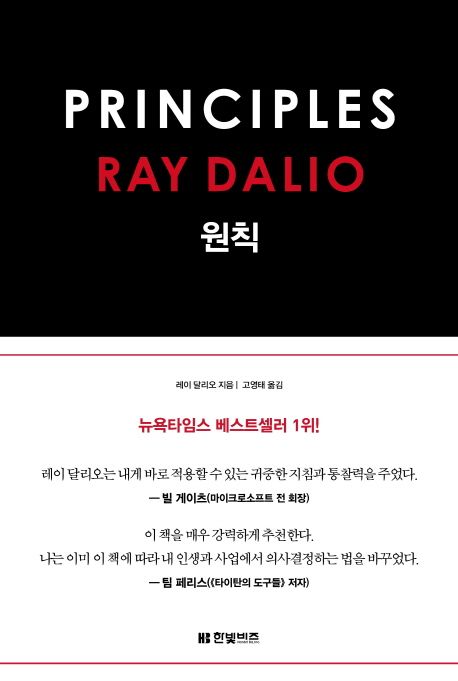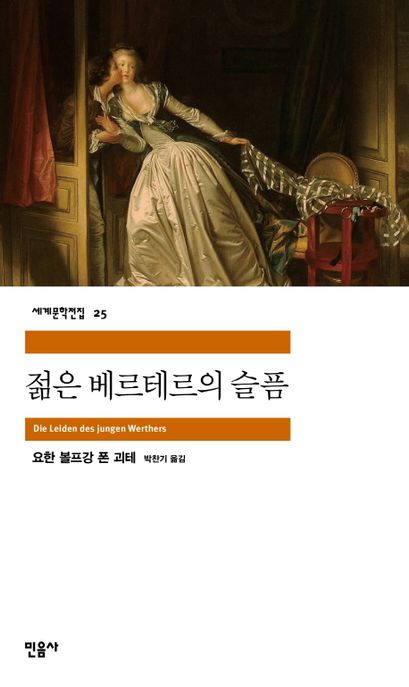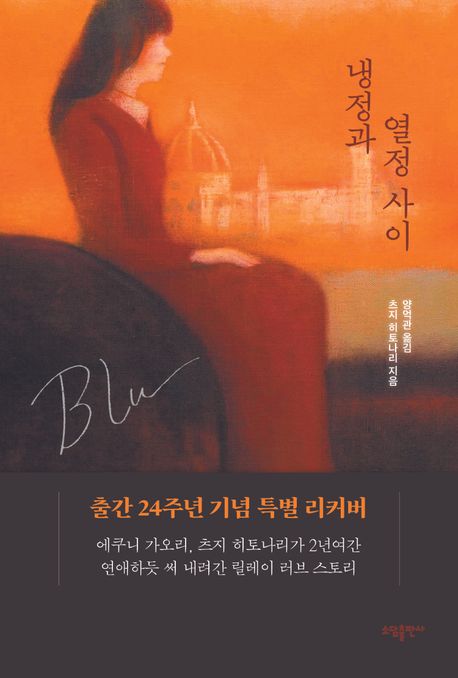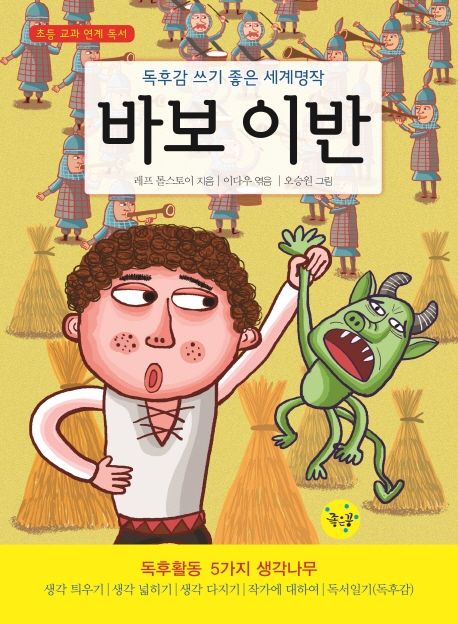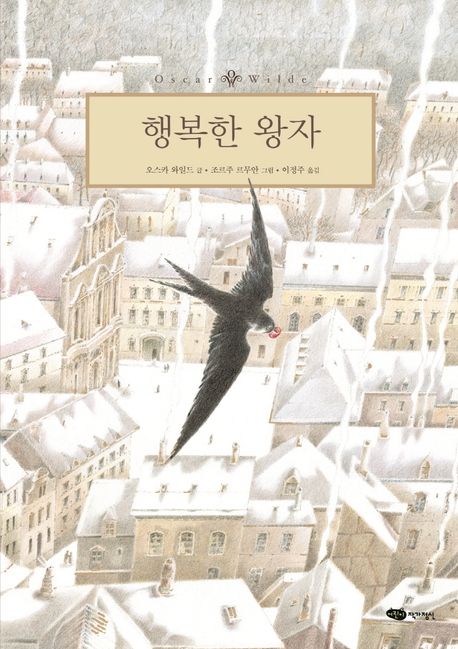이 책의 첫 구절은 ‘아버지가 죽었다..’ 로 범상치 않은 시작을 한다. 그리고 주인공은 일반적으로 부모님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과는 다르게 아버지의 죽음을 자신의 해방이라고 표현하였다. 그 이유는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권위적이고 불편한 존재처럼 주인공에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주인공이 그 해방이라는 감정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 아버지의 삶을 되돌아봤을때,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서서히 바뀌었다. 이 책이 쓰여진 시대적 배경을 미루어 봤을때, 6.25전쟁, 산업화 등의 혼란 속에서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살아온 아버지였음을 짐작해볼 수 있었고, 그 모든 권위적인 태도가 생존의 방식이었음을 주인공은 천천히 이해하게 된다. 이 책을 읽고 나서 나는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했었는가, 그리고 어떤 아버지가 될 것인가 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것 같았다. 그리고 단순히 아버지의 이야기 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족, 역사, 해방, 사랑 등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는 책이라고 생각했다. 주인공이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 해방을 했듯이, 우리도 각자의 해방일지를 찾아가게 될 것이라는 교훈을 주는 책이었다.
노르웨이의 숲
네가 떠나기 전
내게 했던 말은
여전히 내 마음 한 구석을 자리해
나를 괴롭힌다.
.
난 너를 사랑했고
사랑했던 너는
나를 떠났지만
그럼에도 나는 너를 잊을 수 없기에
.
.
계절은 변하고 시간은 쌓여간다.
네가 없는 이곳에서
너를 떠올리는 일이 나는 너무도 괴롭다.
원칙
원칙이란 무엇인가.
자신만의 ‘원칙’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의 올곧음,
이 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복잡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하나의 원칙과 자신만의 신념은
버팀목으로 자리하지 않겠는가.
사양
애정하는 작가의 책 중 제일 좋아하는 책,
사양
‘논리는 결국 논리에 대한 사랑이다. 살아 있는 인간에 대한 사랑이 아니다.
역사, 철학, 교육, 종교, 법률, 정치, 경제, 사회, 이런 학문 따위보다
한 처녀의 미소가 숭고하다는 파우스트 박사의 용감한 실증.
학문이란 허영의 또 다른 이름. 인간이 인간답지 않으려는 노력이다.’
.
사람과 사랑과 혁명을 위하여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새로운 사랑이 찾아왔고,
그녀에게 빠지는 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내 시선 속 그녀는 너무도 아름답고 어여쁘지만,
그대는 다른 이의 여인이기에
내 마음 뒤로 하고
행복을 빌어드립니다.
부디 매번 건강하시길.
냉정과 열정사이 Blu
냉정과 열정 사이,
모든 시절을 함께 했던 기억을 뒤로 하고 산다는 건 어려운 일이며,
작별하는 일에는 큰 힘이 드는 법.
내게도 “쥰세이” 같은 사람이 찾아온다면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떠나보내 주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달빛 조각사 1 (남희성 게임 판타지 소설)
가상현실 게임 로열로드가 전 세계를 휩쓸고 이 게임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찾기 힘든 시대가 들어섰습니다. 그러던 와중 빈곤한 집안 사정 때문에 수전노의 성격을 가지고 돈을 모으던 이현이 작품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기계가 너무 비싸 게임에 관심이 없었으나 어쩌다보니 기계를 구하게 돼 게임을 통해 돈을 모을 목적을 가지고 “위드”라는 닉네임을 짓고 처음 접속을 하게됩니다. 기본적으로 머리가 좋고 운동신경이 좋던 게임에 대한 지식은 크게 없어 다른 게이머들과 다른 기행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는 오히려 그만의 강점이 되게 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현실적인 주인공에 몰입하면서 볼 수 있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바보 이반 (독후감 쓰기 좋은 세계명작)
어느 마을 부유한 농부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중 셋째 아들인 농사를 성실히 하지만 바보인 이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산을 나누는데에 조금의 문제가 있었지만 이반은 물욕이 크게 없어 이반이 자기 몫을 양보해주는 식으로 들의 균열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화로운 모습이 맘에 안들었던 건지 악마가 나타나 형제들의 사이를 갈라놓고자 하였고 머리가 좋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게 먹히나 싶었으나 바보였던 이반에게는 그렇지 않아 이반이 이를 해결하는 내용을 담습니다. 오히려 바보였던 점이 악마를 이길 수 있던 게 웃기고 그의 순수함이 책을 읽는 저에게도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신의 카르테 1
의학 소설로 실제로 작가가 의사였던 경험을 살려 구체적이고 현실감 느껴지는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주인공 구리하라 이치토는 나츠메 소세키를 광적으로 좋아하는 괴짜 내과 의사입니다. 괴짜인 것은 제쳐두고 실력 하나는 보장되어 그 실력을 바탕으로 환자를 치료해나가는 내용인데 본 에피소드에서는 29세 췌장암 환자와의 대립을 다루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오래 살리고 싶은 의사와 남은 시간을 병원이 아니라 가족 곁에서 보내고 싶은 환자 둘 다 잘못된 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립되는 것이 슬픈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에피소드들이 저에게 좋게 여겨져 의학 콘텐츠에 관심이 있다면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행복한 왕자
어느 마을에 금과 보석으로 화려하게 치장한 행복한 왕자라는 동상이 있었습니다. 한 제비는 왕자와 만나게 되고 착한 심성을 가진 왕자는 제비에게 자신을 치장하고 있는 보석들을 불쌍한 이들에게 나눠달라 부탁을 하게 됩니다. 제비는 왕자를 두고 갈 수 없어 겨울이 오기전에 남쪽으로 떠나야 했으나 그의 곁을 지키며 부탁을 계속 들어주다 그의 곁에서 동사를 하고 맙니다. 왕자 또한 보석을 계속 나눠주다 보니 볼품이 없어졌고 마을 사람들은 동상을 철거하고 그 심장까지도 용광로에 녹여 쓰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책은 흔히 알고있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비슷한 얘기와 많이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동상이 불쌍하게 여겨지나 결국 천국에 가는 모습에 안심이 되며 이러한 삶은 나로서는 무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