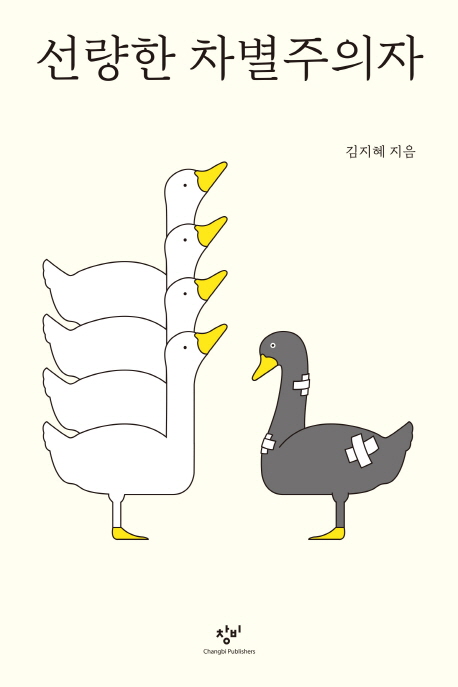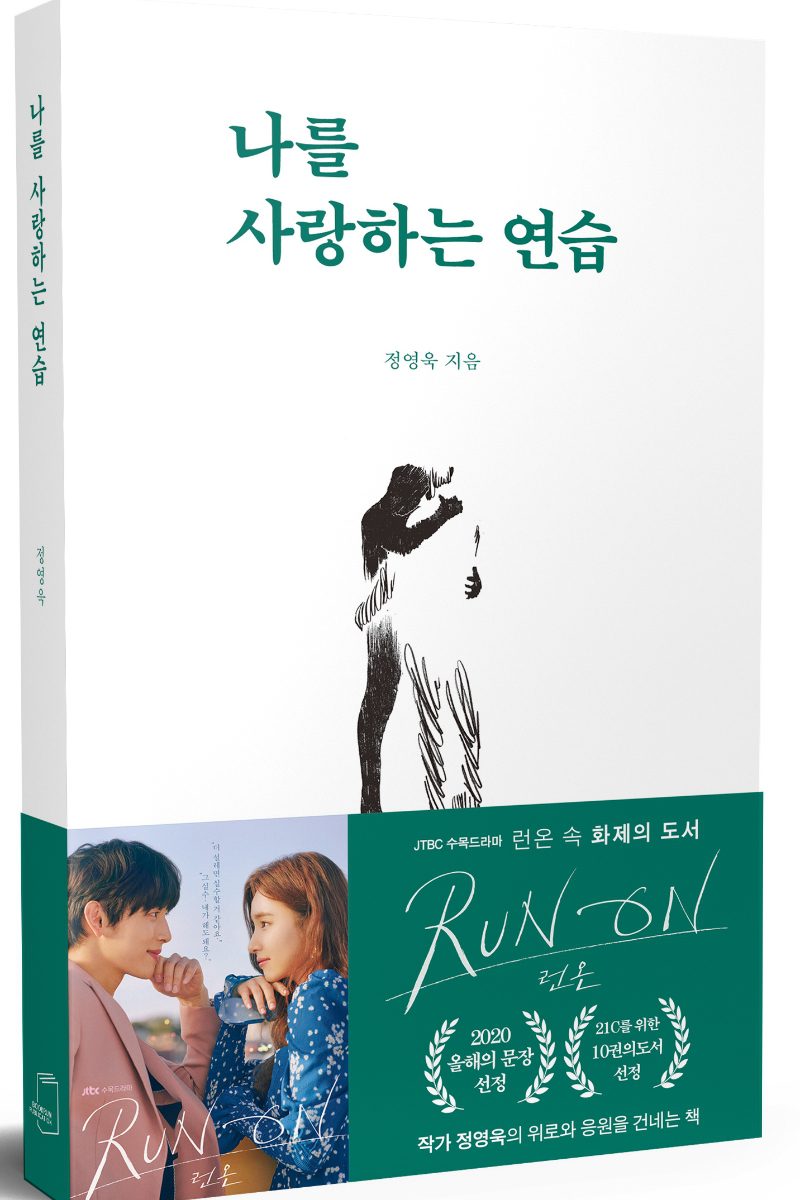새의 선물을 읽고 진희와 나의 공통점을 찾곤 했다. 책을 읽을때 많은 사람들이 그럴것같다. 물론 작가도 그정도의 몰입도가 되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설정할 것이다.
그렇지 못한 인물들은 조연도 될수 없고 그저 몇페이지 지나가는 엑스트라가 될 뿐이다. 물론 그 인물들의 인생에서의 하이라이트를 따로 뽑아보면 다를지도 모르지만.
진희는 굳이 따지자면 지금의 나보단 과거의 나와 공통점을 많이 공유하는 인물이다. 가장 최악의 것을 생각하고 자기 방어하는 점이 특히나 그렇다. 예전에 나는 그랬다.
가장 최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결국 상처받게 된다고 생각했다. 내가 무언가에 기대하는 것 자체가 괴로웠다. 사춘기가 지나면서 의존적인 인간으로 성장해 버렸지만 그때는 그랬던것 같다. 가장 다른 점은 지금의 나는 수다스럽고 나는 표현하길 좋아하는 성격으로 성장했다는 점이다. 난 나를 표현하는게 좋다. 감추는건 잘 못하겠다. 때론 이런 성향이 방해가 될때도 안좋은 방향으로 작용할때도 있다. 그래도 이미 이런 모양으로 성장해 버린 내모습에 적응해 나가고 있다. 소설은 담담한 문체로 쓰여졌지만 나는 왠지 모를 따뜻함을 느꼈다. 작가의 섬세한 감정선에 나도 그 상황을 경험해보지 않았음에도 거기 있는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런 느낌을 주는 책은 좋은 책이라는 감상이 항상 있다.
한국적인 소설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이책이 마음에 든것 보면 나도 어쩔수 없는 한국인인가보다. 확실히 특유의 감성이 있다. 그리고 따라가기 편해서 좋았다. 잘 읽힌다는 느낌을 주는 소설을 오랜만이라 좋았다. 이 작가의 다른 책들도 읽어보고 싶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