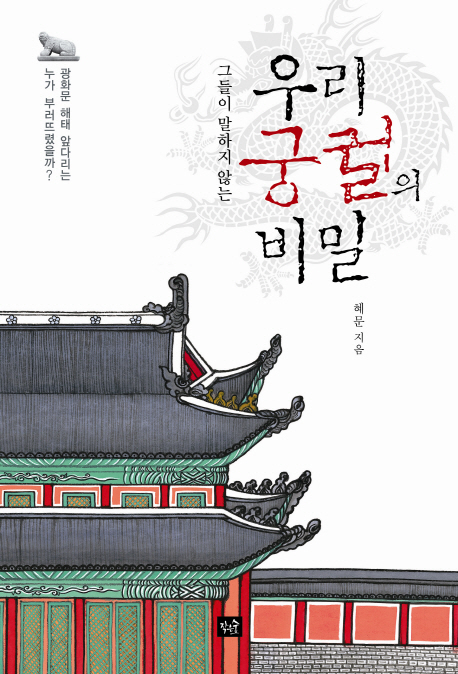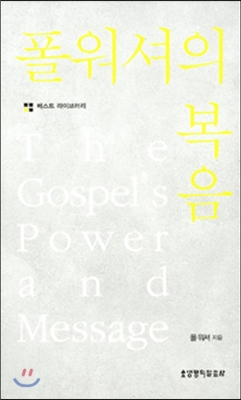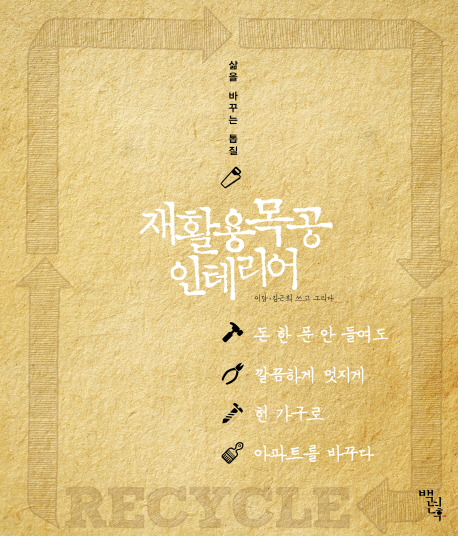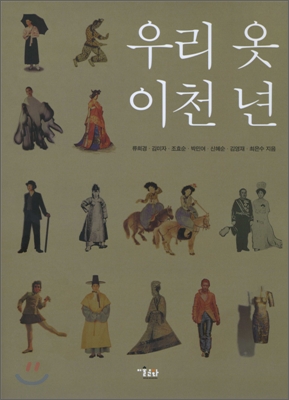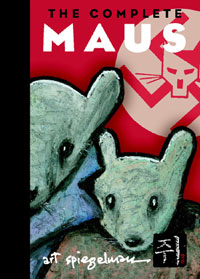프란츠 리스트의 ‘르 말 뒤 페이’. ‘순례의 해’라는 소곡집의 제1년, 스위스에 들어 있는 곡
형태가 없는 곳에 잠겨 지내지만, 모순적으로 기차역이라는 형태를 만들어내는 직업을 가진 다자키 쓰쿠루. 그는 색체가 있는 네 친구들에 속해있었다. 아니 속한 것 그 이상으로 연결되어있었다. 영혼적으로. 남자 둘은 성이 아카마쓰(赤松)와 오우미(靑海)고 여자 둘은 성이 시라네(白根)과 구로노(黑埜)로 각각의 이름 속에는 색채가 들어있다. 다자키만이 색깔과 인연이 없었다. 그 때문에 다자키는 처음부터 미묘한 소외감을 느꼈다. 그래도 그 그룹은 쓰쿠루에게 10대의 전부였다. 시로의 주장에 의해 쫓겨나기 전까지는.
“그녀의 집 거실에 있던 야마하의 그랜드 피아노. 시로(시라네)의 꼼꼼한 성격에 맞게 늘 조율이 잘되어 있었다. 티 하나 없이 맑게 윤기를 띤 표면에는 손가락 자국도 없었다. 창으로 비쳐 드는 오후의 햇살. 정원의 사이프러스가 늘어뜨리는 그림자. 바람에 흔들리는 레이스 커튼. 테이블 위의 찻잔. 뒤로 단정하게 묶은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과 악보를 바라보는 진지한 눈길. 건반 위에 놓인 열 개의 길고 아름다운 손가락. 페달을 밟는 두 발은 평상시 시로를 생각하면 상상이 안 될 만큼 힘차면서도 적확했다. 그리고 종아리는 유약을 바른 도자기처럼 하얗고 매끈했다. 연주를 부탁하면 그녀는 곧잘 그 곡을 쳤다. ‘르 말 뒤 페이’.”
시로(시라네)는 다른 친구들에게 쓰쿠루에게 강간당했다고 주장했다. 물론 이는 사실이 아니었지만. 경멸과 두려움이 가득한 시로의 눈을 보고 친구들은 그녀의 말을 안믿을 수 없었고, 그렇게 쓰쿠루는 그룹에서 쫓겨난다. 얼마 후 시로는 혼자사는 본인의 집에서 누군가에게 살해된 채 발견된다. 그녀의 방안엔 범죄자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고, 노란 끈만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피아노를 치는 모습이 누구보다 아름다웠던 시로. 하지만 점점 그녀 자신의 윤기를 잃어가던 시로. 그녀의 안에는 무엇이 떠다녔기에 자신을 잃게되었을까. 이는 그녀 자신도 모르고 쓰쿠루 역시 알 도리가 없었다.
구로(구로노)를 만나기위해 쓰쿠루는 핀란드로 떠났다. 그녀가 핀란드인을 만나 결혼한 후 이민을 갔기 때문이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도자기를 빚으며 살고 있었다. 남편의 도자기는 색체 조화가 아름답고 균형미가 넘쳤다. 그의 아내 구로의 도자기는 다양한 색체를 쓰지 않아 소박한 느낌을 주었고, 정형화된 틀의 도자기가 아닌 조금은 삐뚤하고 균형이 맞지 않지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었다. 쓰쿠루가 느낀 구로 역시 그랬다. 구로와의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도쿄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그는 오랜만에 텅 빈듯한 감정을 느꼈다. 아니 그의 속에서 줄 곧 있던 텅 빈 감정을 오랜만에 ‘인식’했다.
“어쩔 수 없지 않은가, 쓰쿠루는 자신을 향해 말했다. 애당초 텅 비었던 것이 다시 텅 빌 따름이 아닌가. 누구에게 불평할 수 있단말인가? 사람들은 그에게 다가와 그가 얼마나 텅 빈 존재인가를 확인하고, 다 확인한 다음에는 어딘가로 가 버린다. 그 다음에는 텅 빈, 또는 더욱더 텅 비어 버린 다자키 쓰쿠루가 다시금 혼자 남는다. 그 뿐이지 않은가.”
무색무취라고 ‘주장’하는 다자키 쓰쿠루, 그의 마음 속에는 여러가지 구멍들이 있었다. 외로움, 형태가 없는 곳에서 형태를 쫓는 ,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 어딘가, 실재하는 것과 실재하지 않는 것의 사이에서 그는 무언가를 보았고 느꼈다. 오늘도 그는 리스트가 연주하는 르 말 뒤 페이를 조용히 듣고 있을 것이다. 그것이 자신을 위해, 시로를 위해 순례를 떠나는 길이기에.
사실 그의 이야기를 읽고 뭐라 할말이 없다. 무슨 교훈을 얻은 것도 아니며, 큰 감탄이 나온 적도 없었다. 제목 그대로 어느 색채따위 보이지 않았다. 단 이 책을 읽고 나에게 한 가지 변화가 생겼다. 이전에는 애매모호한 상황이나 말을 맞딱뜨리면 그냥 애매모호하다고 넘겨버리거나 애써 무시했다면, 이제는 그 애매모호함 자체를 느끼게 된 것 같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과거엔 그냥 이상한 일로 치부해 버렸다면, 이젠 그 상황을 ‘이유를 알 수 없는 일’ 그 자체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것이 무슨 변화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변화 그 자체일 것이다. 즐거운 일이 딱히 없었지만 행복하다면 그냥 행복한 것이고, 딱히 슬플일도 없었지만 괜시리 울고 싶다면 그냥 울고 싶은 것이다. 누구보다 담담한 다자키 쓰쿠루를 보며 나 역시 그를 닮아가는 것 같다.
르 말 뒤 페이(Le Mal du Pays). 전원 풍경이 마음에 불러일으키는 영문 모를 슬픔. 향수 또는 멜랑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