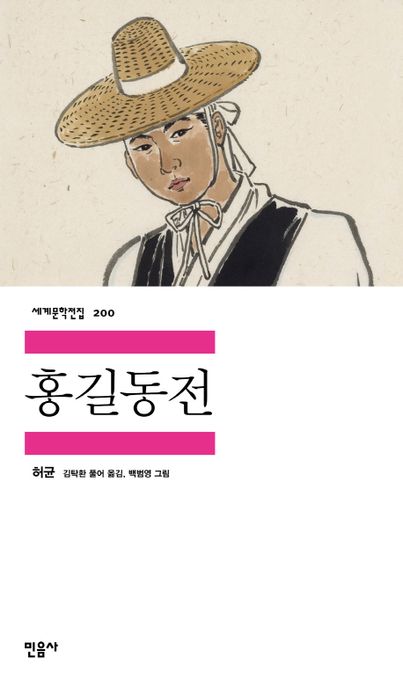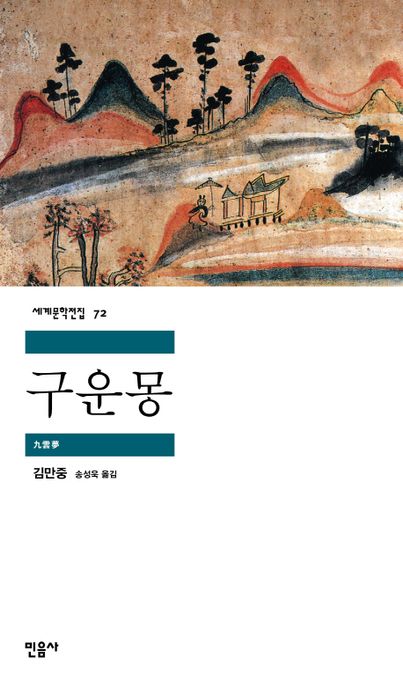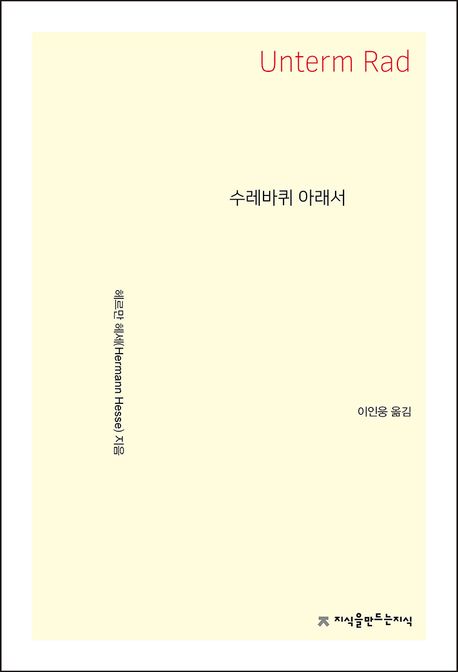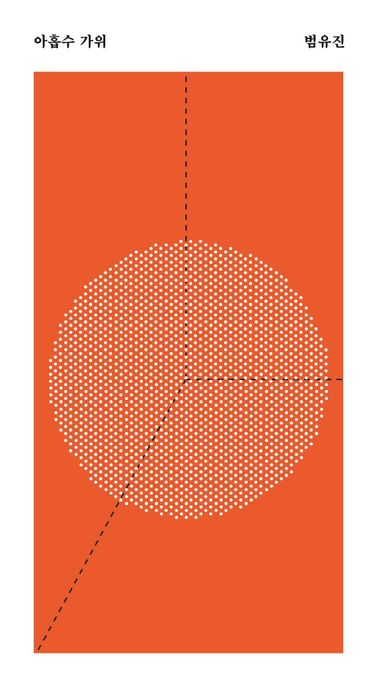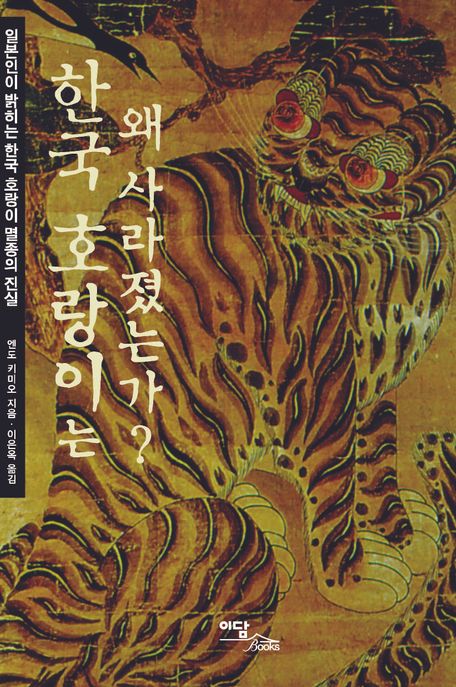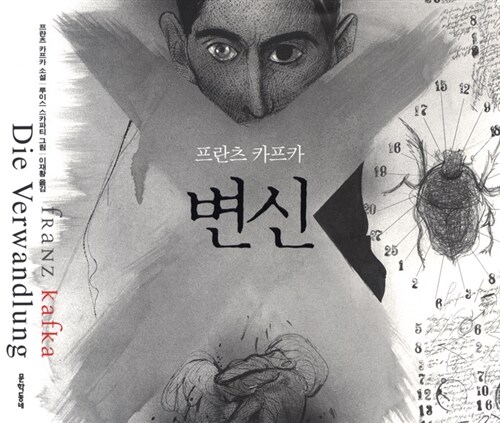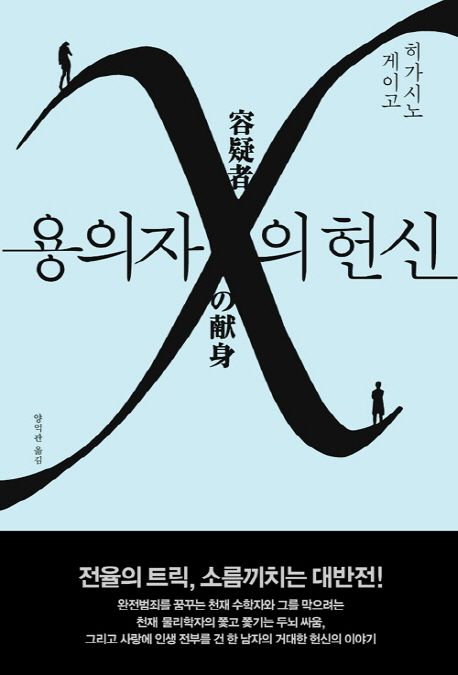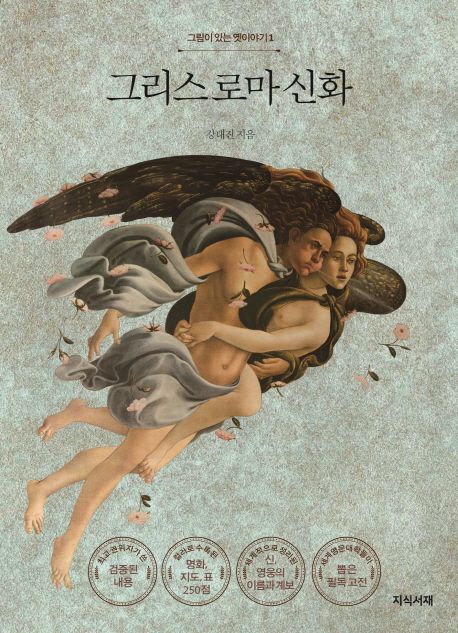전공 과제를 위해, 해당 책을 선정한 후 읽게 되었다. 이 책을 읽음으로써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도적인 ‘홍길동’의 이야기를 어릴 적 읽었던 동화보다 더욱 심화하여 바라볼 수 있었다. 또한, 그의 행적을 다양하게 탐구하며 결과적으로 새로운 관점에서 이를 읽을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책을 통해 자신의 상상력과 탐구력을 기를 수 있었던 것 같아 무척 의미 있는 경험이자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겁내지 않고 그림 그리는 법 (그림 유튜버 이연의 그림을 대하는 마음)
에세이이면서, 그림 그리기에 대한 정보도 담겨 있는 책.
유튜버 이연의 영상에는 그림뿐만 아닌 마음가짐을 배워갈 수 있는 조언들이 담겨있어 자주 보는 편이다.
“잘 보는 사람이 그만의 창작을 한다. 습관적으로 관찰하면 볼 수 있는 세계가 넓어진다.
그 덕분에 나는 작은 것 하나에도 큰 의미를 발견하는 재주를 가지게 되었다. 평소에 많은 것들을 관찰하고 메모해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최근 그리기를 게을리 했던 나였는데, 이 책을 읽으며 마음가짐을 다잡게 되었다.
제목 그대로, 겁내지 않고 다시 펜을 들게 해주는 책이다.
구운몽
문득, 어릴 적 읽었던 <구운몽> 만화책이 떠올라 이 책을 읽게 되었다. ‘꿈’이라는, 어쩌면 흔한 전개를 사용했지만, 고전소설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신선한 전개를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불교를 주제로 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 다다르기까지 수많은 여정담을 담고 있기 때문에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다.
수레바퀴 아래서
주인공 한스는 작은 마을에서 똑똑한 아이로 불렸다. 신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좋아하는 수영과 낚시를 포기한 채 하루종일 공부에 몰두한다.
그 결과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어 신학교에 입학한다. 기숙사 학교에 들어간 한스는 하일러라는 아이를 만나게 된다.
하일러는 시를 쓰는 아이였고 학교의 엄격한 규율을 견디다 못해 반항적인 아이였는데, 모범생이었던 한스는 하일러와 친해지게 되면서 변하기 시작한다.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한 이후 하일러는 사라졌고, 한스는 매일 두통에 시달리다 요양 휴가를 보내라는 말에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온다.
쇠약해진 모습의 아들은 본 엄격한 아버지는 걱정과 실망감을 감추려 애를 쓴다. 죽음이라는 선택을 고민하던 한스는 엠마를 만나며 엠마를 좋아하게 되지만
그는 한스를 버리고 떠나버렸고, 다시 한스는 외롭게 살아가다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된다.
기계 수습공이 되어 다시 시작해보기로 마음을 먹었고,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대장장이 사람들과 함께 늦게까지 술이 마시게 된다.
어둑한 밤이 되어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가지만 다음날 싸늘한 주검이 되어 강물 아래로 떠내려가게 된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한스가 강압적인 사람들은 만나게 되며 변화하는 점이 안타까웠다.
책을 읽으며 그가 행복해지기를 계속 바랬다. 하지만 좋아하던 엠마에게도 버려지고, 끝내 강물에 빠진 장면을 읽으며 허무하고 씁쓸함을 느꼈다.
교육에 있어서 아이가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된다.
경성을 뒤흔든 11가지 연애사건 (모던걸과 모던보이를 매혹시킨 치명적인 스캔들)
현재보다 더욱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경성 시기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등장하는 인물은 모두 실존하는 차세대 모던걸들이며, 그들의 행동과 가치관을 통해 전혀 새로운 인식을 심어준다.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당시의 연애관과 태도들을 보여주기에, 역사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
아홉수 가위
주인공의 나이는 29세, 흔히 아홉수라고 말하는 그 나이에 주인공은 죽기 위하여 옛날 할머니와 살았던 집으로 간다.
집 주변은 온통 밭이고 좁은 샛길 끝에 위치한 단층 양옥집이다.
주인공은 음식이 가득 찬 상자 두 박스를 챙겨가 상자 안에 들어있는 음식을 다 먹으면 죽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그 날 밤부터, 가위에 눌리기 시작한다.
밤마다 자신의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치는 귀신과 동고동락하는 신세가 된 주인공은, 서로에게 쌓인 오해들을 풀어가며 서로 친해진다.
귀신과 자신의 사연을 서로 풀어가며 다시금 살아갈까 고민하는 이야기.
복잡한 내용은 없지만, 위로와 격려를 느낄 수 있는 짧은 소설이기에 금방 읽어나갈 수 있다.
서늘하고 다정한 위로가 글로 잘 나타나있는 책.
한국 호랑이는 왜 사라졌는가? (일본인이 밝히는 한국 호랑이 멸종의 진실)
본래 교양 과제로 인해 읽은 책이지만, 배울 점이 굉장히 많았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상징인 호랑이가 절멸하는 과정을 한국인이 아닌 일본인이 직접 서술하며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다시금 떠올릴 수 있었다.
변신
‘내가 만약 바퀴벌레가 되면 어떡할꺼야?’ 한동안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밈이다. 하지만, 만약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어떨까?
해당 소설의 주인공은 실제로 바퀴벌레가 되어 삶이 송두리째 바뀌게 된다. 친절하던 가족들에게는 외면받고 주변인들을 만날 수도 없으며 자신의 방 안에서만 갇혀있는, 말 그대로 벌레 취급을 받는다. 여기서, 주인공을 대하는 가족의 태도가 한순간에 돌변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사람의 인격이 분명 남아있음에도, 생김새가 변했다는 이유만으로 냉담한 반응을 드러내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우리 사회의 모순을 관통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 속에서 ‘물질 자본의 사회 속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도태되어 버리는 인간을 바퀴벌레에 비유한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용의자 X의 헌신 (제134회 나오키상 수상작, 갈릴레오 시리즈 3)
거의 1년 간 책을 읽지 않은 내가, 올해 처음으로 선택해 읽은 책이다. 평소 소설 분야를 좋아했고 ‘게이고’ 작가의 명성은 익히 들었기에, 저절로 이 책을 선택한 것 같다. 예상대로 등장인물들에게 게이고 작가만의 감정 묘사가 고스란히 나타나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사랑과 헌신을 중심으로 추리 소설을 전개하는 방식이 신선하게 느껴졌다.
그리스 로마 신화
어릴 때 만화책으로 자주 읽었던 책인데 어른이 되어서 해당 책을 기반으로 독서클럽 팀원들과 토론해볼 수 있는 주제를 생각해보며 다시 읽으니 감회가 새로웠다. 지난 학기에 서양사 관련 교양을 들으면서 트로이 전쟁에 대한 내용을 배웠었는데, 그 기억을 되살려 토론 주제를 발제해보기도 하였다. 첫 번째 토론 주제는 신은 존재하는가에 대한 토론이었다. 개인적으로 해당 주제가 첫 번째였던 것이 굉장히 새로웠다고 생각한다. 신의 존재를 전제로 삼아야 하는 해당 책에 대해 토론하면서 신의 존재 유무부터 토론을 시작했던 것도 그렇고, 우리 팀 전원이 신은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편중된 것도 신기했다. 3회차에서 파리스의 황금사과 신화에 대해 만약 자신의 자식이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신탁이 내려왔다면 자식을 기꺼이 버리거나 죽일 것인지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는데, 개인적으로 이 질문에 대해 굉장히 많이 생각해봤었다. 팀원들 대부분은 자식을 버리겠다는 의견이었는데 개인적으로 그것에 어느 정도 동의하면서도 그렇게 쉽게 단정 지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팀원 중 1명이 난 당장 내가 나라를 망하게 할 존재라면 기꺼이 본인을 희생하겠다는 말을 한 것이 인상깊기도 했다. 난 자세한 상황 설명도 없이 다짜고짜 대의를 위해 희생하라는 말을 들으면 싫다고 거절할 게 뻔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번 독서클럽은 저번에 진행했던 독서클럽보다 조금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했는데, 그만큼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볼 수 있어서 재밌었다. 특히 방중 독서클럽과 달리 교수님이 직접 참관하시고 주제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들려주시니 얻어갈 것도 많은 시간이었던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