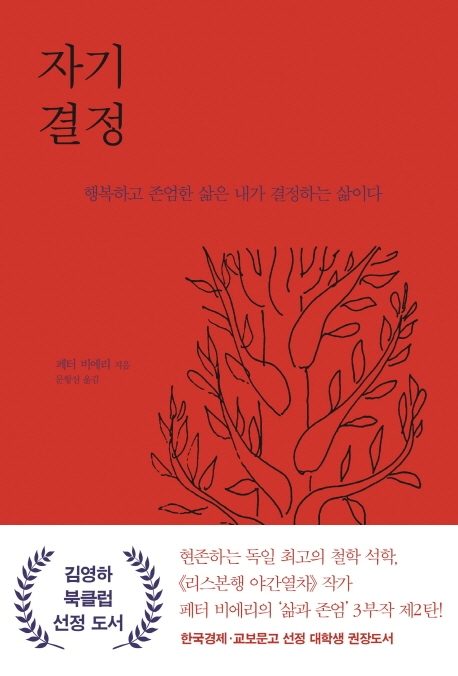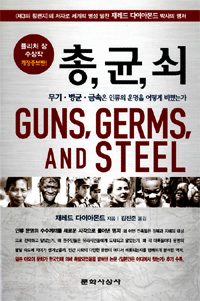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기존의 소설과 다른 내용 구성과 소름 돋는 결말이다.
처음 부분을 읽고 이해가 되지 않아 여러 매체를 통해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했다.
대부분의 반응은 ‘기존의 소설과 다른 로맨스 소설이다.’ 혹은 ‘ 나중에 보라색 부분을 읽어봐라’라는 반응이 대다수였다.
나 또한 이 소설을 읽을 당시 가볍게 읽기 시작했다. 처음 부분을 보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소설이 어려운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첫 장면부터 사실 어렵게 다가왔다. 미리 사전에 조사하고 읽었으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그렇게 1장의 챕터가 종료되었다.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무비스타’부터 읽어보았다. 무비스타에는 주인공의 과거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인공이 왜 그 나이에 비해 성숙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알게 해준다.
어머니에게 ” 죽지마”라고 말하는 주인공의 모습이 서글프게 다가왔다. 무비스타 당시 주인공의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주인공에게 연민과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그 부분을 읽고 갑자기 든 생각은 저 “죽지마”의 대상이 어머니가 아니라 주인공 본인에게 하는 말이 아닐까 싶었다.
그 이후 ” 내가 처음 당신의 얼굴을 보았을 때” 부터 주인공과 여자의 만남이 시작된다. 여자는 첫 등장부터 외모지상주의의 피해자로 자존감이 굉장히 없는 것처럼 보였다.
주인공은 백화점에 일하면서 ‘요한’이라는 인물을 만난다. 요한은 겉으로는 밝고 자신감이 넘쳐 보이지만 후반부에 자실시도를 할 만큼 그 내면에 슬픔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인공과 여자는 요한에게 의지했지만, 요한은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았다. 요한이 “세상은 거대한 고아원이다”라는 말을 남긴 채 세번째로 자살 시도를 하는 장면은 충격적이었다.
무엇보다 요한은 주인공과 여자에 비해 어머니와 관련된 상처를 가지고 있으나 극복한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다.
또한, 요한이 세상이 마치 거대한 고아원 같다는 말이 의지할 사람 없이 외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부각해주기에 그의 자살시도가 안타깝게 다가왔다.
주인공 또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의 대상이 아닌, 말 그대로의 <그녀>와 <요한>이었다.”라는 말을 한 것처럼 주인공도 그들에게 연민의 감정을 동등하게 느끼고 있었을 것이다.
이 책은 주로 외모지상주의로 인해 상처받은 세 사람 이야기를 다룬 것 같다. 각자 다른 상황이지만 자세히 보면 주인공, 요한, 여자 모두 “외모”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책을 읽고 ‘과연 진정한 아름다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해보았다. 교수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하셨을 때 나는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이 책에서 말하는 혹은 대다수의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생각했을 때 아름다움은 외면의 아름다움이라 생각했기에 스스로 부끄럽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책을 읽고나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깨닫게 되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사람의 내면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한 번쯤은 모두 이 책을 읽고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정말 한 편의 오래된 로맨스 드라마를 본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독서클럽을 진행한 덕분에 좋은 책을 읽은 것 같다.